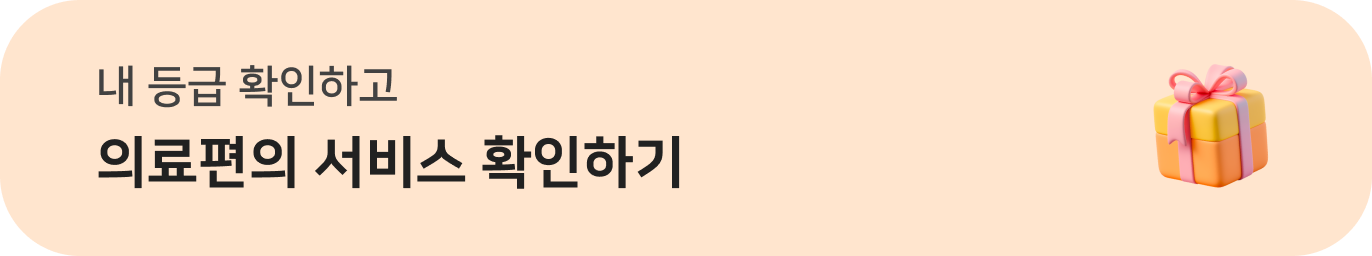2022.12.02 22:03:13
글 : 박찬일
대부분의 경우 와인은 음식에 곁들여 마신다. 이전에도 여러번 설명했듯 와인은 음료이자, ‘국’의 역할을 한다. 서양 음식에 국물 요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튜, 스프나 콩소메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독 요리에 가깝다. 그래서 목을 축이기 위해 와인을 물처럼 마시는 게 오래된 서양의 관습이었다. 물론 미국에서는 콜라나 소다가 그 몫을 했지만.
와인바의 유행과 안주
그래서 서양 메뉴에는 보통 ‘안주’가 없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안주 개념이 있다. 한국의 서양 음식 식당에서 안주 달라고 하면 메뉴에 ‘사이드 디시’라고 적혀있다. 이는 실은 안주가 아니라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음식이다. 매시드 포테이토, 감자튀김, 콩이나 채소 볶음 등을 말한다. 술을 잘 마시기 위해 먹는 안주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다. ‘곁들인다’는 의미만 같을 뿐이다. 안주는 술에 곁들이고, 사이드 디시는 메인 요리에 곁들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이드 디시의 대표격인 감자튀김 등이 맥주 마실 때 나오다 보니 안주로 여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
서양에 와인바 붐이 분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그것이 한국, 일본에도 전해졌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에서 와인바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한국, 일본보다 늦다. 원래 와인바 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행을 타는 시점이 더 늦었다는 뜻이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원래 존재하는 바에서 한 잔씩 마셨다. 그러다가 와인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바, 즉 와인바가 와인 종주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한국은 와인을 술로서 대우했다.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입가심으로 와인바를 찾는 일이 흔하다. 1990년대에 프랑스, 이탈리아의 와인 산지를 여행하고 와인 바를 찾았는데 안주가 거의 없어서 솔직히 혼이 났다. 안주가 있어야 술을 맛있게 마시는 나같은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뜻이다. 와인은 명주인데, 안주가 없다니! 서양의 와인바, 특히 생산지에 있는 바들은 좋은 와인을 잔으로 판다. 평소 비싸서 못 마시던 와인을 한 잔씩 싸게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제는 안주가 부실하다는 것. 올리브, 스틱 브레드 정도가 고작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천년대 들어서 이들 서양에서도 와인바가 크게 퍼지고 음식 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예 미쉐린급의 고급 요리가 나오는 와인바도 많아졌다.
가벼운 와인바로 시작해서 레스토랑급으로 변하는 가게도 많아졌다. 이는 자국의 수요라기보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와인 탐방객의 수요에 맞춰 일어난 현상이다. 와인을 맛보고 기왕이면 현지의 음식을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 아닌가. 한국의 안주처럼 작은 요리 접시들이 나오는 곳도 많다.
전통적으로 안주 개념이 약한 서양에서도 와인바 붐에 의해 안주라고 볼 만한 요리가 생겨나고, 팔고 있다. 이를테면, 올리브처럼 절인 음식, 튀김 종류, 커팅한 치즈와 살라미류 같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많은 와인바에서 제공하는 조개탕 같은 시원한 해장용 안주는 없지만.
새로운 안주 요리 레시피
얼마 전에는 버터로 만든 안주를 신문에 소개해 주변에 반응이 컸다. 도대체 버터가 어떻게 안주가 되느냐는 회의론자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실천파까지 다양했다. 내가 소개한 것은 버터를 거의 통째로 먹는 안주다. 우선 일회용 버터를 준 비한다. 그 위에 꿀을 뿌려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안주로 내는 것이다. 단맛이 돌고 버터의 풍미가 서서히 입에서 녹는다. 무거운 레드 와인에 잘 어울린다. 물론 단맛이 있기 때문에 디저트 와인에도 좋다. 소테른이나 달콤한 모스카토 같은 와인에 궁합이 뛰어나다.
조금 더 손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신문에 소개한 것이다. 한입 크기 버터를 냉동실에 넣어 얼린 후 설탕을 뿌려서 토치로 지진 후 먹는 방법이다. 디저트 중에 ‘크렘 브륄레’(이탈 리아에서는 크레마 코타라고 부른다)라는 게 있다. 노른자와 크림을 섞어 저온에서 익힌 후 차갑게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설탕을 표면에 뿌려 지져내는 디저트다.
설탕 피막은 바삭하게 되어 씹 는 맛이 생기고, 노른자 크림(일종의 커스 터드다)은 녹진하게 입에서 퍼지는 우아한 디저트다. 이를 버터에 응용한 것인데, 가볍게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달콤한 음식은 안주로 먹지 않는 것이 한국 술꾼의 보편적인 관습이다. 그렇지만 단맛은 술 맛을 더 끌어올리기도 한다. 초콜릿이 위스키 안주로 알려져 있지만, 레드 와인에도 얼마든지 잘 어울린다. 특히 견과류가 들어간 봉봉(한입 크기로 가공한 초콜릿)은 메도크 지역 레드 와인에 딱 맞는다. 알고 보면 고르곤 졸라 치즈에 잣을 얹고 꿀을 뿌려내는 것도 와인 안주로 좋지 않은가. 단맛도 와인에 훌륭하게 매치된다는 뜻이다. 와 인 안주라고 해서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치즈, 살라미, 생햄이 전부는 아니다. 확장시켜서 더 좋은 안주를 만들어볼 수 있다. 그렇다고 빙과를 잔뜩 사서 와인 안주로 먹겠다고 생각하시진 말기를.
다만, 위에 쓴 크렘 브륄레 스타일의 버터 안주는 정말 제격이니 꼭 해보시길.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싸게 먹히니까.
단, 설탕을 뿌려 지진 후에는 가급적 빨리 먹어야 한다. 버터가 녹아버린다. 이런 상황이 귀찮으면, 버터 대신 작게 포장된 크림치즈 안주를 사용하면 된다. 녹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술상에 놓여 있어도 문제없다.
박찬일 로칸타 몽로 셰프 겸 음식 칼럼니스트